[위생과 문화의 만남… 공중화장실의 아름다운 변신]
[물 없는 화장실]
[경복궁 수세식 화장실]
[남자 공중화장실에 줄이 없거나 짧은 이유]
위생과 문화의 만남… 공중화장실의 아름다운 변신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계기로 ‘공중화장실 위생 개선’ 인식 확산
햇빛-조명 등으로 밝게 유지하면, 세균 증식 막아 공중보건에 도움
AI 등 첨단기술로 안전성 높이기도

한국화장실문화협회와 행정안전부가 1999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선정된 충남 천안시 망향휴게소 화장실의 내부 모습. 어린이과학동아 제공
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1999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80곳의 화장실을 응모했고, 이 중 27곳의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망향휴게소 화장실이 차지했습니다. 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한옥 문화의 특징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중략) 소변기 하단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오염 발생을 줄이고 화장실 내부를 쾌적하게 만든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2002 한일 월드컵이 이끈 화장실 혁명
정부는 1999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 시상해 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운수, 전력 같은 동력 및 공중위생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가리킵니다. 공중화장실도 그중 하나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위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담당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됐고, 국내 공중화장실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깨끗하고 편의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클래식 같은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시민에게 공개된 공공시설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흔히 ‘문화 수준의 척도’로 불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에게 지역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장실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음식을 먹고 소화한 뒤 남은 대변과 노폐물이 쌓여 만들어진 소변을 배출합니다. 화장실은 노폐물 배출 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공간이죠. 대변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등의 병원체가 사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폐물에 남은 병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의 개념이 자리 잡기 이전 인도와 유럽 등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 사망한 것도 오염된 물과 분뇨 때문이었습니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간 병원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에 포함되거나 주변 공기로 퍼지면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개인의 위생을 잘 지켜도 감염병이 퍼지면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은 공중보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세기 들어 하수도가 보편화되면서 유럽에서 콜레라의 창궐은 줄어들었지만,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대소변에서 기인한 병원체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과학
대소변이 변기와 바닥 등에 묻어 있으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병원균이 공기에 떠다니면서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기와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또 대소변이 묻은 휴지 등이 버려진 휴지통에서도 병원균이 퍼질 수 있어 가급적 휴지통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의 밝기도 위생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악취를 방출하는 곰팡이가 잘 자라나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켜거나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다. 어두운 타일을 깔면 빛을 모두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밝은 타일을 사용하는 쪽이 세균 증식을 늦추기에 유리합니다. 1999년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은 수원시 반딧불이 화장실을 설계한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동훈 대표는 “햇빛이 낮에 잘 들어오도록 서쪽에 창문을 크게 내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혁명 초반에는 주로 ‘위생’이 아름다운 화장실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 ‘접근성’ 등의 기준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성동구는 관내 공중화장실에 인공지능융합기술(AIo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 168대를 설치해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학습한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센서를 연결한 뒤, 센서에 감지된 움직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AI가 경찰에 신고하는 기술입니다. 성동구 청소행정과 문선우 주무관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어 위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절약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재료공학과 빈 수 교수팀은 물 없이도 대소변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변기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변기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을 만든 뒤 미끄러운 실리콘 오일을 발라 매끄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흙탕물과 우유 등의 물질이 물 없이도 미끄러졌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찾을 수 있거나 주변 건물 바로 옆에 설치하는 등 위치를 잘 선정하고,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장애인, 노약자 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화장실문화협회 표혜령 대표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중화장실이 되려면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깔거나, 문을 여닫을 때 손이 끼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효빈 어린이과학동아 기자, 동아일보(25-01-14)-
_______________
물 없는 화장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의 고층 빌딩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속의 파이프를 통해 흘러내리고 있을 X의 폭포를 생각한다. (…) 서울의 이 거대하고 운명적인 X을 생각하면서 나는 문득 삶에 대한 경건성을 회복한다.’ 김훈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작가가 소년 시절인 1950년대 분뇨로 넘쳐난 서울 골목길을 회상하며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요즘 서울시는 분뇨를 하루 1만1844㎥(2020년 기준) 처리하고 있다. 이 작업이 닷새 정도만 지연되면 도시는 마비된다.
▶18세기 유럽의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분뇨 처리였다. 2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요강이 차면 하수구나 길거리에 그냥 부어 버렸다. 당시 유럽 도시의 길거리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분뇨가 옷에 묻지 않도록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하이힐’의 원조라고 한다. 챙 넓은 모자도 창 밖 투척에 대비해 옷과 머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가 발달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개발하고 하수도 체계를 정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250년 전이다. 수세식 화장실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화장실은 물과 전기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여전히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5억명은 비위생적 화장실을 쓰거나 그마저도 없어 야외에서 볼일을 본다. 이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매년 5세 이하 어린이 36만명 이상이 장티푸스, 설사, 콜레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빌 게이츠 재단은 2011년부터 2억달러 이상을 들여 물과 전기를 쓰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화장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사용자당 하루 비용이 5센트가 넘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동안 아이디어나 시제품이 120여 건 나오긴 했다. 바이오 막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걸러내거나 태양열로 가열해 바로 비료로 만드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대량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다. 결국 게이츠 재단은 2018년 삼성에 참여를 요청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이 3년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기술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 뒤 고체는 탈수·건조·연소 과정을 통해 재로 만들고, 액체는 바이오 정화 방식을 적용해 물로 바꾸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화된 것도 불과 얼마 전이다. 6·25 때 한국에 온 미군은 도처에 널린 분뇨에 경악했다고 한다. 그런 나라가 이제 저개발국에 첨단 화장실을 지원하게 됐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2-08-27)-
______________
경복궁 수세식 화장실
하이힐은 원래 패션 용품이 아니었다. ‘풍속의 역사’를 쓴 독일 사학자 에두아르트 푸크스는 하이힐이 분뇨를 피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각 가정에서 창밖으로 버린 분뇨를 밟지 않으려고 만든 신발이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영국에서 수조에 저장한 물을 내려보내는 방식의 수세식 변기가 등장하면서 거리 모습이 달라졌고 하이힐도 지금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됐다.

▶수세식 화장실 역사는 1만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유적이 발견될 만큼 오래됐다. 우리도 8세기 통일신라의 안압지 인근에서 물로 분뇨를 흘려보내는 수세식 화장실이 출토됐다. 로마 제국 시절 프랑스 남부 도시 비엔에는 겨울철 엉덩이가 시리지 않도록 난방 장치까지 갖춘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 하지만 수세식이 수인성 질병 창궐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악화시켰다. 1850년대 영국에서 콜레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분뇨를 정화 과정 없이 템스강에 흘려보낸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유럽의 공중 위생은 화장실 위생 개선의 역사다.
▶경복궁에서 150년 전 만들어졌다가 땅에 묻혔던 공중(公衆)화장실 유적이 엊그제 공개됐다. 수세식에다 정화 시설까지 갖췄다. 물 들어오는 곳보다 나가는 곳을 높여 잠시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분변의 자연 발효를 촉진하는 과학적 구조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만 누리는 호사였다. 1894년 조선 땅을 밟은 영국인 이저벨라 버드 비숍은 “한양은 세계에서 베이징 다음으로 더러운 도시”라고 했다. 사람들은 거리에 인분을 그냥 버렸다.
▶‘화장실이 불결한 나라’였던 한국은 1988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계기 삼아 화장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대거 교체했다. 하드웨어 개선에 이어 2002년 월드컵 때는 ‘화장실 청결하게 사용하기'라는 소프트웨어 도약도 이뤘다. 1999년부터 해마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노력한 덕분이기도 하다.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화장실을 보고 감탄한다. 휴대폰을 꺼내 내부를 찍어 갈 정도다.
▶지난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은 수원 화성행궁 인근 ‘미술관 옆 화장실’은 소지품 선반, 방수 콘센트, 동작 감시 센서와 LED 조명, 여성을 위한 수유실과 영유아 침대까지 갖췄다. 시민들 이용 행태도 선진국 수준이다. 지금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제대로 된 화장실 없이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 우리도 그런 나라였다. ‘한강의 기적’이 화장실에서도 이뤄진 셈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1-07-10)-
_____________
남자 공중화장실에 줄이 없거나 짧은 이유
용변 보는 것을 'relieve oneself'라고 한다. '볼일을 보다'를 에둘러 말할 때는 'do one's business'라고 하고, '소변보다'는 'do number one', '대변보다'는 'do number two'라고 표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in order to prevent its spread) 수시로 손을 씻으라고 해서 조금 달라졌지만, 남성 10명 중 7명은 '넘버 원'이든 '넘버 투'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난 뒤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여자화장실에는 줄이 긴데, 남자화장실에선 줄줄이 들락날락하는(keep going in and out) 것은 변기 숫자 탓이 아니라 손을 씻고 안 씻고 차이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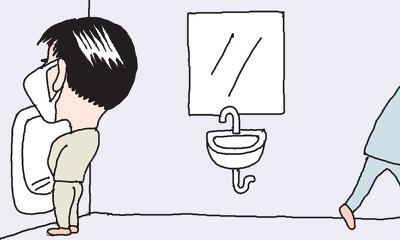
코로나19는 공중위생의 불안감을 주는 현실과 불편한 진실(disturbing reality and inconvenient truth of the public hygiene)을 속속 들춰내고 있다(bring them to light). 그중 하나가 남자들은 소변기 사용 후에도(after using a urinal)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부 남성은 한 손으로 볼일을 보며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냥 나온다. "기껏 '넘버 원' 하면서 두 손으로 부여잡고 손 씻으러 가느냐"고 내심 다른 남성을 비웃기도 한다(laugh at him in their sleeves).
이들은 "발에 떨어지지 않게 (소변) 줄기를 조종하고(steer the stream away from my feet), 볼일 끝난 뒤 챙겨 넣기 전에 흔드는데(shake it before pack-up) 한 손이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말한다. "그 부위에 땟국이 끼어 있는(be covered in grime)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오줌을 뿌린(spray piss onto my palms) 것도 아닌데 손을 소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get the urge to sterilize my hands) 않는다"며 "자기 엉덩이를 핥아대는 애완동물(arse-licking pet)을 한참 쓰다듬고도 안 씻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어떤 이들은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 마지못해 대충 물 뿌리는 시늉을 하는(put on a cursory splash of water)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흠뻑 젖은 손으로 헤매느니(faff around with soaking wet hands) 지저분한 공중화장실(filthy public restroom)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낫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손을 씻어야 한다. 공중화장실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breeding ground)이기 때문이다. 잽싸게 소변만 보겠노라 잠깐 다녀 나오더라도(nip in for a quick piss) 그 사이에 만지는 모든 것에 세균이 숨어 있다(lurk on everything you touch).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공기를 통해 여기저기 뿌려진다(get sprayed up through the air with every flush).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요즘엔 어디에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at any chance you can get) 20초 이상 손을 씻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그런데도 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않는 남성들은 말한다. "거기에 손대기 전에 씻어야 한다면 씻겠지만, 그 후에야 씻을 필요 있나요."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조선일보(20-03-24)-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國內-이런저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11을 불러주세요!" 뉴욕 버스 안에서 응급 상황] (0) | 2025.01.19 |
|---|---|
| [키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명하세요] [한국의 성범죄 量刑] (0) | 2025.01.16 |
| [1등 당첨돼 패가망신한 사람과 기사회생한 사람의 차이] (0) | 2025.01.12 |
| [어머니 휴대폰 못 열어… 부고 못 돌리는 일 없어진다] (0) | 2025.01.11 |
| [여의도 女, 한남동 男] ....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 (0) | 2025.01.10 |